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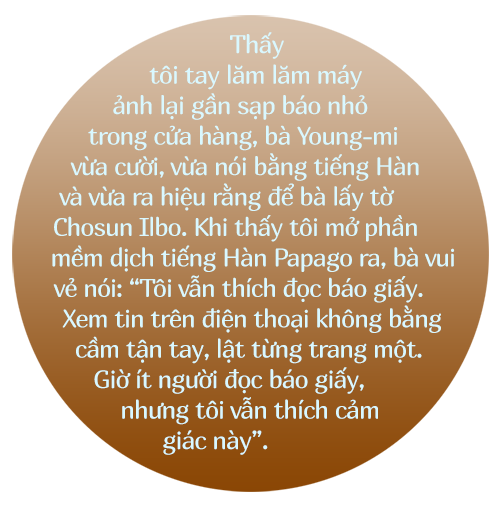
그날 아침, 비가 그친 후 서울의 공기는 더욱 시원하고 상쾌해졌습니다. 젖은 보도 위로는 나뭇잎 사이로 은은한 햇살이 스며들어 반짝이는 빛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종로3가역 근처 GS25 편의점에서는 어르신들이 신문을 들고 웃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동아일보가 대선 후보 네 명의 생방송 토론에 대해 분석하고 논평한 내용을 논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카메라를 들고 가게 안 작은 신문 가판대로 다가가는 저를 보고 영미 씨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어로 말하며 조선일보를 가져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제가 파파고 한국어 번역 앱을 켜자 영미 씨는 기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종이 신문 읽는 게 좋아요. 휴대폰으로 뉴스를 읽는 건 손에 들고 한 장씩 넘기는 것만큼 재밌지 않아요. 요즘 종이 신문 읽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저는 여전히 그 느낌이 좋아요."
GS25 사장인 황인엽 씨는 매일 80~100부 정도의 각종 인쇄 신문만 받아 매장 바로 앞 신문꽂이에 진열한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오전 9시에서 12시 사이에 사람들이 신문을 사러 오는데, 주로 은퇴자나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저녁에도 가끔 신문을 사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인엽 씨는 또한 주변 편의점(CU 등)과 비교해도 위탁판매 신문의 양이 여전히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보통 하루에 50~70부 정도만 받고, 어떤 매장은 20~30부만 받기도 합니다.

"제 가게는 도심에 위치해 있어 오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손님이 더 많아요. 어르신들께 신문을 사는 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추억의 일부, 도시 생활과 바깥 세상 과의 연결고리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분들은 커피 한 잔과 함께 국수나 주먹밥을 사서 가게 안 식사 공간에 앉아 천천히 신문 페이지를 넘기기도 하세요." 황인엽 씨가 말했다.
코리아헤럴드에서 일하는 제 동료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인들이 신문을 사려고 줄을 서는 풍습이 있었지만, 지난 8년 동안 가판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신문은 몇 부 남지 않았고, 신문 가판대는 이제 빵 진열대와 자동 커피 머신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구석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같은 신문들은 주로 충성도 높은 노년층 독자들을 위해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종이 신문을 읽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활 방식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이처럼 작고 익숙한 신문 가판대의 모습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여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이나 로손 같은 편의점에서도 작은 코너를 마련하여 중장년층 독자들을 위한 신문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편, 섬나라 싱가포르에서는 편의점의 작은 신문 가판대가 보존되어 현대 도시 한가운데서 정보를 얻는 전통적인 방식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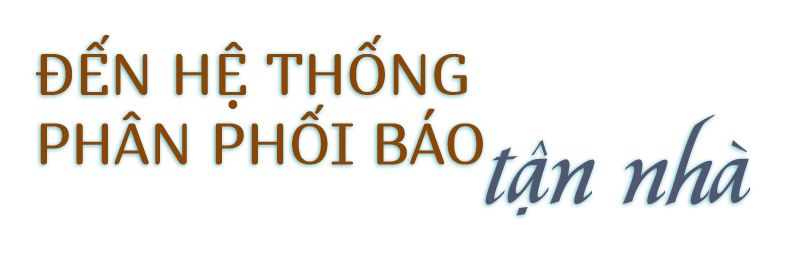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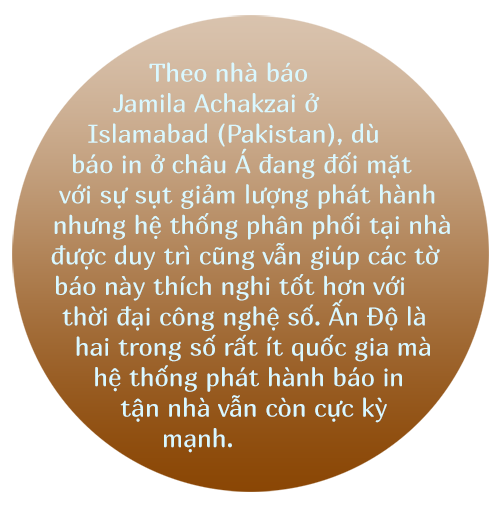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의 기자 자밀라 아차크자이에 따르면, 아시아의 종이 신문은 발행 부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디지털 시대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가두 배포 시스템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가두 배포 시스템이 여전히 매우 강력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 다이닉 바스카르, 힌두스탄 타임스와 같은 신문들은 도시에서 시골 지역까지 매일 수백만 부의 신문을 배달하는 배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이른 아침 자전거나 오토바이로 신문을 배달하는 사람들인 "페이퍼왈라"가 주거 지역에서 익숙한 이미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광고 보조금 덕분에 신문 가격이 저렴(10루피/1장, 5,000동 미만)하여 인도의 종이 신문은 여전히 대중에게 인기 있는 선택입니다. 이 시스템은 각 지역에 맞춰 매우 효율적이고, 고도로 지역화되었으며, 유연한 모델로 운영됩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월별, 분기별, 또는 연도별 장기 신문 구독 문화가 여전히 고령층 독자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신문, 마이니치 신문 등 주요 신문사는 각 가정에 배달 거점 역할을 하는 '도쿠바이텐(신문 대리점)'이라는 지점을 운영하는 유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일본에는 전국에 약 1만 4천 명의 신문 대리점이 있으며, 매일 새벽(보통 새벽 2시부터 5시까지)에 신문을 배달하는 사람은 20만 명이 넘습니다.

한때 지방 우체국을 통해 방대한 종이 신문 배포 시스템을 운영했던 중국은 이제 대부분 디지털화되었습니다. 인민일보와 같은 일부 주요 신문사는 당 기관, 학교, 도서관에 종이 신문을 배포하고 있지만, 일반 독자에게는 종이 신문이 디지털 뉴스 앱, 비디오 플랫폼, 위챗 뉴스레터로 대체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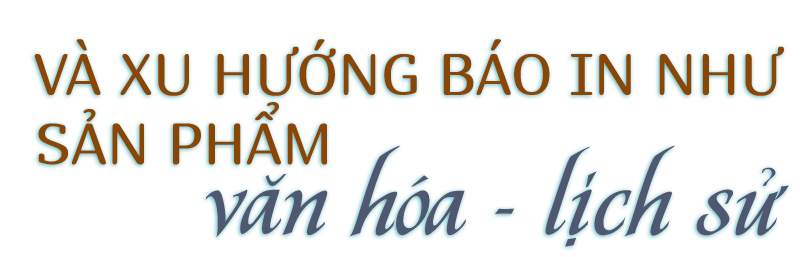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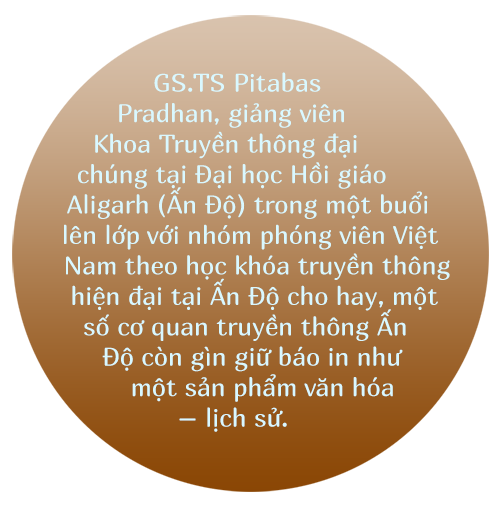
그러나 정보 소비 습관의 변화와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종이 신문은 점차 그 입지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종이 신문은 점차 디지털 뉴스에 중심적인 위치를 내주어야 했습니다. 디지털 뉴스에서는 모든 정보가 휴대폰 화면을 몇 번만 탭하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한때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언론을 자랑했던 한국처럼, 종이 신문은 대중 매체라기보다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유물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한때 매일 수백만 부씩 발행되던 한국의 대중 신문은 이제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뉴스로 대체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종이 신문 발행 부수는 2010년 대비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종이 신문 광고 수익이 급감하면서 많은 언론사들이 인력 감축, 부서 통합, 또는 전면 온라인 뉴스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예외가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인민일보와 남방주간지 같은 대형 언론사들이 모바일 앱, 소셜 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에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종이 신문은 관공서나 도서관 등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의례적인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반면 일본의 종이 신문은 조간 신문을 읽는 뿌리 깊은 습관 덕분에 훨씬 더 오랫동안 존속해 왔습니다. 요미우리 신문과 아사히 신문이라는 양대 일간지는 전성기 이후 발행 부수가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최대 일간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언론사들도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디지털판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유료 콘텐츠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수억 명의 사람들(특히 농촌 지역)이 인터넷에 정기적으로 접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이 신문이 여전히 비교적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인도나 파키스탄에서는 종이 신문의 수가 (특히 코로나19 이후) 소폭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종이 신문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위치를 재편하기 위해 "후퇴"하고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나 온라인 뉴스와 속도를 두고 경쟁하는 대신, 종이 신문은 이제 깊이, 신뢰성, 그리고 기록적 가치에 집중하며 노인, 학자, 교사, 또는 인터넷이 아직 보급되지 않은 외딴 지역 주민 등 특정 독자 집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리가르 무슬림 대학교(인도) 대중 커뮤니케이션학과 강사인 피타바스 프라단 교수는 인도에서 현대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수강하는 베트남 기자들과의 수업에서 일부 인도 언론사들이 여전히 인쇄된 신문을 문화적, 역사적 산물로서 보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편집부는 뗏 신문, 연감, 과학 잡지 등 특별호에 투자하여 집단적 기억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아름답게 인쇄되고 정교하게 표현됩니다. 또한, 인쇄된 신문 독자의 독서 트렌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마케팅팀을 고용하여 적합한 기사와 보도 자료를 제작합니다.

피타바스 프라단 교수는 "이는 종이 신문이 점차 대량 소비재의 역할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목할 만한 방향입니다."라고 강조하며, 인도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에서도 종이 신문은 농촌 지역 인구 비율이 높고 인터넷 접근성이 불균형적이기 때문에 아시아 여러 국가보다 여전히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협회(Persatuan Wartawan Indonesia, PWI)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콤파스(Kompas), 미디어 인도네시아(Media Indonesia), 자와포스(Jawa Pos)와 같은 유명 신문사를 포함하여 300개 이상의 종이 신문사가 여전히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피타바스 프라단 교수는 인도네시아에서 종이 신문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이유는 첫째, 유통 시스템이 전통적인 유통망과 소매망을 결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언론사들이 일반 독자들의 경제 상황에 맞춰 저렴하고 간결한 종이 신문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콤파스(Kompas)와 같은 일부 신문사는 종이 신문을 분석, 장문 인터뷰, 탐사 보도에 특화된 "심층 버전"으로 전환했으며, 최신 뉴스 섹션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전했습니다. 피타바스 프라단 교수는 "신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 전략은 기존 독자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더 많은 젊은 독자를 유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분명 인쇄 매체는 더 이상 뉴스의 주요 원천은 아니지만,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보고입니다. 정보의 소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이러한 존재와 아시아인들의 독서 습관은 인쇄 매체가 디지털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유지하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약 80억 달러의 인쇄 신문 매출로 이 지역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당 기관지와 국영 언론 시스템에서 발생합니다. 일본에서는 요미우리 신문이 하루 약 580만 부의 발행 부수를 기록하며 세계 최대 신문 발행 부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일본신문발행부수감사국(JABC)의 2024년 6월 자료 기준). 아사히 신문과 닛케이 신문이 각각 하루 339만 부, 130만 부 이상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으며, 온라인 신문 구독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Dainik Bhaskar는 2025년 1분기에 하루 15만 부라는 놀라운 증가를 기록하며 총 발행 부수가 약 430만 부/일로 증가했고, The Times of India는 하루 340만 부/일을 돌파했습니다. 신문 출판 산업의 매출은 60억 달러로 추산되며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인도 신문 발행부 감사국, 2025년 1분기 기준).
한편, 한국에서는 2022년 신문 산업(인쇄 신문과 온라인 신문 포함) 매출이 약 33억 8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에는 약 35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쇄 신문 광고 수입만 2024년에 약 4억 5천 5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KPF)과 한국유통부수검사인증원(KABC)에 따르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등 주요 신문사는 하루 78만 부에서 120만 부 이상까지 다양한 발행 부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인쇄 신문이 여전히 비도시 지역에서 주요 정보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콤파스 그라미디어(Kompas Gramedia), 자와 포스(Jawa Pos), 템포(Tempo)와 같은 주요 출판사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총 산업 매출은 약 20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개발도상국으로서는 상당한 규모입니다. 말레이시아의 신문 시장은 안정적인데, 신츄 데일리(Sin Chew Daily, 중국어)는 하루 약 34만 부, 더 스타(The Star, 영어)는 하루 24만 8천 부 이상을 발행하는데, 이는 언어와 사회 구조의 다양성을 반영합니다.
작지만 규모가 작은 싱가포르에서는 종이 신문이 주로 중장년층 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여전히 편의점과 정기 구독을 통해 정기적으로 배포됩니다. 한편,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에서는 종이 신문이 농촌 지역과 인터넷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방글라데시의 프로톰 알로(Prothom Alo)는 하루 약 50만 부, 파키스탄의 우르두어 신문 장(Jang)은 하루 약 80만 부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cand.com.vn/Xa-hoi/bao-in-chau-a-tai-dinh-vi-thoi-ky-cong-nghe-so-i772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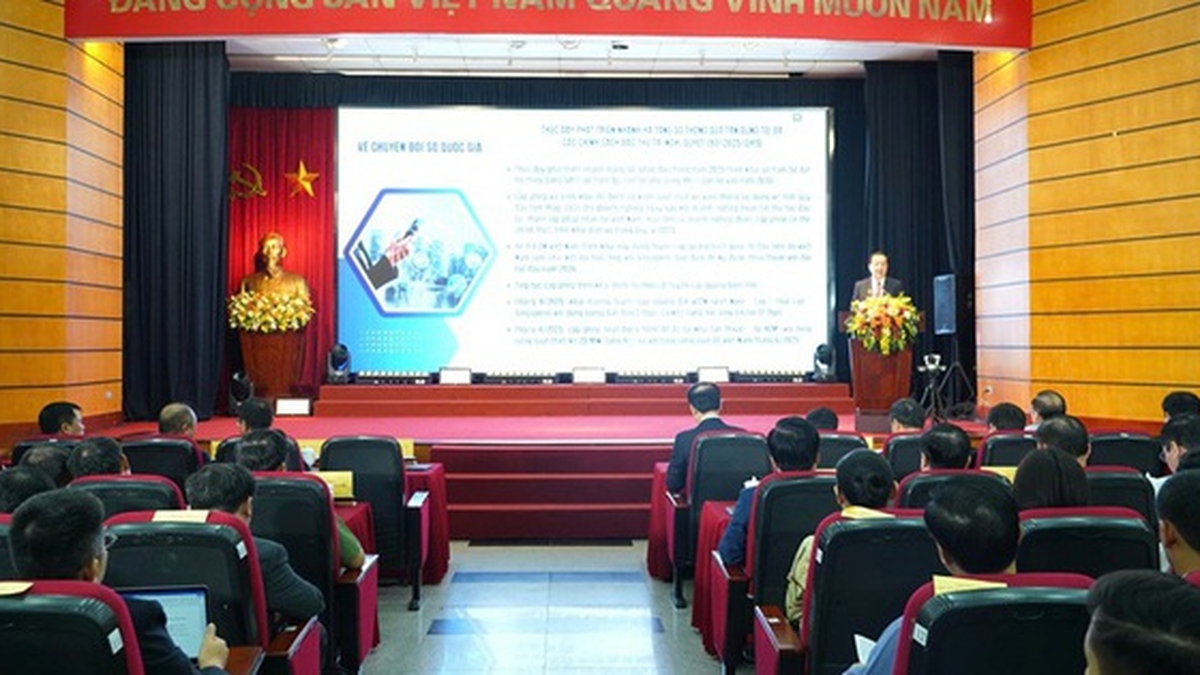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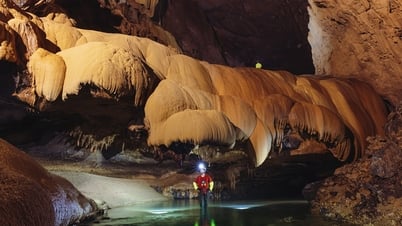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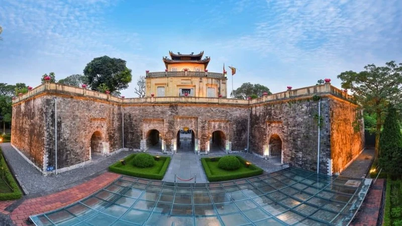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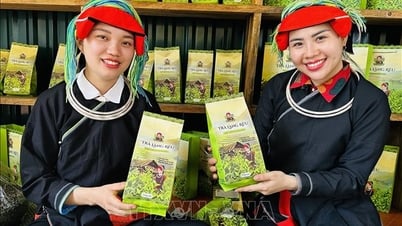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