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쩐 레 칸의 시를 읽으면서 나는 세상의 먼지에서 본당으로, 작은 개미의 상태에서 "나"와 "부처"의 본성을 깨닫는 여정을 봅니다. 이 여정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동시에 연민으로 가득 차 있어, 인간은 고통의 소용돌이와 해방에 대한 갈망 사이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무상함, 환생, 고통 그리고 해방에 대한 욕망
쩐 레 칸의 시에서 두드러지는 주제 중 하나는 무상함, 즉 모든 것은 변하고 인간의 삶은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인식입니다. 이는 "우주는 속눈썹과 같고 / 눈 깜짝할 새에 하루가 간다"라는 명상적인 이미지를 통해 분명하게 표현됩니다. 우주는 갑자기 부서지기 쉽고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은 더 이상 며칠이나 몇 달로 측정되지 않고 눈 깜짝할 새에 측정되며, 만물의 사라짐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함의 정신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무상함은 인간의 삶에도 반영됩니다. "오, 금세 지루하고 목마르는 그대여/ 인생은 익숙한 것들이 서서히 말라가는 시간이다." 이 구절은 너무나 가슴 아프게 들립니다. "금세 지루하고 목마르다"는 욕망으로 가득 차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간의 본성을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구절은 누구나 겪어야 하는 상실을 일깨워줍니다. 오래 살수록 "익숙한 것들이 서서히 말라가는" 것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무상함은 단순한 추상적인 법칙이 아니라, 쓰라린 삶의 경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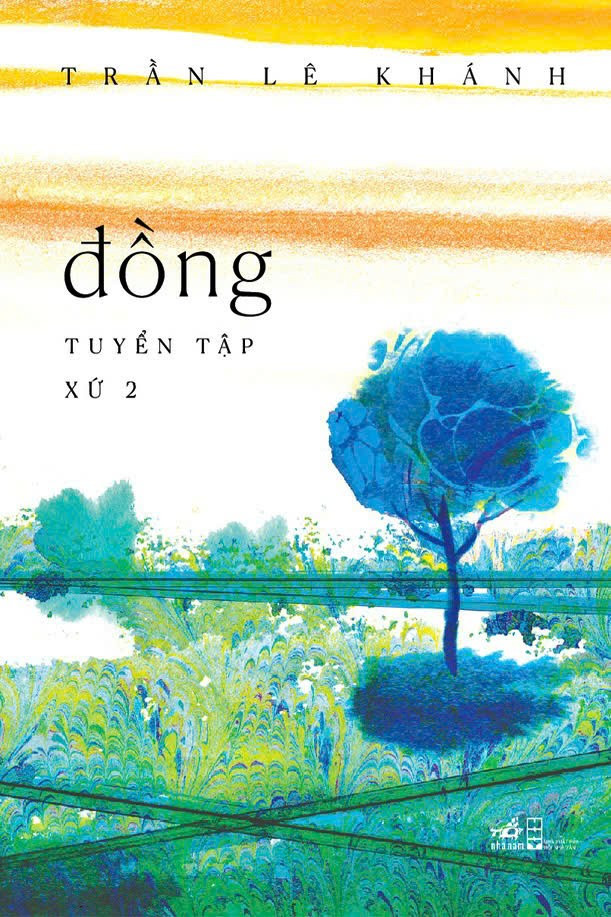
무상함이 근본이라면, 윤회 와 고통은 다른 두 기둥입니다. 쩐 레 칸(Tran Le Khanh)은 영혼의 신비로운 재생과 육체의 쇠퇴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영혼은 겨우 세 살이지만/ 육체는 아홉 번의 생을 굴렀다." 인간 삶의 근본적인 역설: 영혼의 젊음은 늙어가는 육체와 대조됩니다. 이것이 불교의 오온(五蘊) 개념으로, 육체와 정신은 동일하지도 영원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 수많은 폭풍우 같은 생을 거치며/ 바람이 얼굴을 스치지만 여전히 낯설다." 여기서 "낯설음"은 삶의 흐름에서 소외된 느낌과 윤회의 순환 속에서 알 수 없음을 모두 의미합니다. 수많은 생을 거치면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길을 잃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지 못합니다. 이 구절은 슬픔을 담고 있으며, 무아(無我)의 미묘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생을 거치며 존재하는 고정된 자아는 없습니다.
고통은 세속적 삶의 연약함을 통해 실존적 영역에서도 인식됩니다. "세상은 너무나 얇아, 나의 사랑하는 이여/ 천상은 영원히 네 입술을 깨물 수 없을 만큼 좁아. " 세상은 "너무 얇아" 쉽게 깨집니다. 영원해 보이는 천상의 행복 또한 "영원히 네 입술을 깨물 수 없을 만큼 좁아"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구절은 인간 삶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더 높은 세계조차 유한함을 일깨워줍니다. 여기서 쩐 레 칸은 "고통"이라는 개념에 독특한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고통은 박탈일 뿐만 아니라 행복을 유지할 수 없는 무능력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작지만 잊히지 않는 세부 묘사들은 고통을 묘사합니다. "불개미는 밤에 길을 잃고/ 작은 영혼은 하늘을 보기 위해 일어선다." 밤에 길을 잃은 작고 이름 없는 존재의 상징인 개미. 하지만 그 "작은 영혼"은 여전히 "하늘을 보기 위해 일어선다." 그것은 비천한 지위에서 벗어나려는 욕망, 위대한 힘이 아닌 연약한 깨달음을 통한 해방에 대한 갈망입니다.
이처럼 쩐 레 칸의 시는 무상함에서 윤회로, 고통에서 해탈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지는 삶의 순환을 그려냅니다. 그는 무미건조한 가르침을 재현하지 않고, 오래된 국화, 얼굴을 스치는 바람, 밤하늘의 불개미 등 일상적인 이미지로 그 가르침에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 철학을 더욱 가까이 다가가 독자의 의식에 감동시키는 방법입니다.
삶과 미학에 대한 불교 상징과 메시지
쩐 레 칸 시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탑, 승려, 그리고 명상의 순간을 묘사한 이미지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종교적 배경을 지니면서도 미적, 철학적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원은 신성한 공간으로, 모든 것이 영성의 표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원은 신성하고, 풀잎 하나까지도 신성하며, 빛은 오직 중생에게만 비춘다." 사원은 불상이나 경전 때문에 신성할 뿐만 아니라, "풀잎 하나"에도 영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는 모든 중생의 정신을 상징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에는 불성이 담겨 있으며, 모두 깨달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중생에게만 비춘다"는 것은,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야말로 고통이 모이는 곳이자 빛이 가장 필요한 곳임을 일깨워줍니다.
쩐 레 칸의 시에 나오는 탑은 거창한 건축물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단순합니다. "탑은 거칠게 지어졌다/ 잔디밭 위에 몇 개의 목적 없는 계단으로." "거친 탑"은 잔디밭 위에 몇 개의 계단만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불교 생활 방식의 단순함을 보여주며, 탑이 무엇보다도 물질적인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영적인 공간임을 암시합니다.

스님의 모습도 먼지의 세계와 자비의 빛과 연관되어 나타납니다. "스님은 세상의 먼지 사이를 걷고/ 황금빛 햇살이 길 위의 발 위에 드리운다." "세상의 먼지"는 세속의 세계 를 상징하지만, "황금빛 햇살이 발 위에 드리운다"는 정화와 지지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구절은 스님이 변화의 행위로서 세상에 들어오면서도 여전히 고요함으로 빛나며 믿음과 보호를 가져다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감동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스님이/ 본당으로 들어서자/ 그의 그림자가/ 옆으로 비켜선다." 자아의 상징인 그림자가 옆으로 밀려납니다. 본당에 들어서는 스님은 자아를 뒤로한 채 신성한 공간에 녹아드는 듯합니다. 이는 사람이 자아에 지배받지 않고 순수해지는 깨달음의 상태를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쩐 레 칸은 명상의 순간을 비유로 묘사합니다. "나와 부처 사이의 거리는 그의 공허한 마음의 크기와 같다." 이 거리는 공간이 아니라 불교의 핵심 개념인 "공허한 마음"으로 측정됩니다. 이는 인간과 깨달음의 경계가 오직 마음의 공함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단순하지만 심오합니다. 마음이 망상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인간과 부처의 차이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위의 이미지들을 통해 쩐 레 칸은 구체적인 공간( 탑, 승려, 본당 등)과 상징적인 공간( 공허한 마음, 그림자, 개미 등 )을 동시에 아우르는 불교적 공간을 구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그의 시가 베트남 사람들의 정신적 삶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동시에 심오한 철학적 층위를 암시합니다.
미학적 측면에서 트란 레 칸의 시는 선(禪)의 직관과 언어의 현대성을 결합합니다. 선의 직관은 그가 순간을 포착하는 방식으로 표현되는데, 예를 들어 "우주는 속눈썹 하나 / 눈 깜짝할 새에 하루가 걸린다"는 표현은 간결하지만 심오한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언어는 전통적인 구조를 깨고, 일상적인 이미지를 불교적 사상 속으로 끌어들이는 기법으로 표현되어, 시를 낯설면서도 친숙하게 만듭니다.
쩐 레 칸의 시는 선시와 현대 철학시의 모습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얽힘은 독특한 시적 목소리를 만들어냅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깊은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의 시를 읽으면 언어의 아름다움과 격동의 삶 속에서도 평화롭게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쩐 레 칸은 단순하지만 가슴 뭉클한 시구들을 통해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불교에 대한 사색의 여정을 열어왔습니다. 그는 교리를 설파하는 것이 아니라, 시적 이미지를 통해 독자의 의식에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의 시에 담긴 "먼지에서 본당으로"의 여정은 우리 각자가 삶에서 찾을 수 있는 여정입니다. 고통과 무상함에서 벗어나 우리 마음속에서 평화와 해방을 찾는 여정입니다.
출처: https://nhandan.vn/hanh-trinh-phat-tinh-trong-tho-tran-le-khanh-post908463.html



![[사진] 토람 총서기, 정치국 4개 결의안 확산·실행 위한 전국대회 참석](https://vphoto.vietnam.vn/thumb/1200x675/vietnam/resource/IMAGE/2025/9/16/70c6a8ceb60a4f72a0cacf436c1a6b54)
![[사진] 팜민친 총리, 동티모르 외교협력부 장관 접견](https://vphoto.vietnam.vn/thumb/1200x675/vietnam/resource/IMAGE/2025/9/16/b0e99fd9a05846e4b6948c785d51d51f)
![[사진] 토람 사무총장,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 겸 러시아 연방해사위원회 위원장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접견](https://vphoto.vietnam.vn/thumb/1200x675/vietnam/resource/IMAGE/2025/9/16/813bd944b92d4b14b04b6f9e2ef4109b)

![[사진] 정치국 4개 결의안 확산·실행 위한 전국대회](https://vphoto.vietnam.vn/thumb/1200x675/vietnam/resource/IMAGE/2025/9/16/5996b8d8466e41558c7abaa7a749f0e6)















![[사진] 팜민친 총리, 동티모르 외교협력부 장관 접견](https://vphoto.vietnam.vn/thumb/402x226/vietnam/resource/IMAGE/2025/9/16/b0e99fd9a05846e4b6948c785d51d51f)







































































댓글 (0)